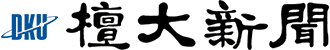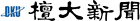[우문]
최근 들어 인문학의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입시 결과에서 철학과와 사학과의 경쟁률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은 다양한 인문학 특강을 통해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배우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학문’이라는 평가를 받던 인문학이, 물질주의에 염증을 느끼는 현대 사회의 위안이 되고 있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평가가 아닌 일시적 유행’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현답]
인문학이 위기를 맞았다고 야단들이다. 사회가 인문학의 쓰임새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학문분과를 전공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 그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꺼리게 되었다는 위기다. 그래서 대학들 본부에서는, 다투어, 쓸모없는 인문학과 따위를 폐지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려 해서 위기론이 대두된 것이다. 철학은 그 위기의 선봉에 서 있다.
이런 위기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에서 비롯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첫째는 인간 삶의 목표에 대한 상반된 이해에서 부분적으로 생기며, 둘째는 철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종種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부분적으로 생기며, 셋째는 제 학문이 그러하듯이 철학을 비롯한 인문과학 역시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조건과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망각한데서 부분적으로 생긴다.

손에 쥐어주는 결정적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철학의 무용론을 혹자 주장한다면 그것 또한 외람되나 무지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철학이 어떤 종류의 지식을 추구하는 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명확한 검증적 답안을 주지 못한다고 유용의 이름으로 철학을 매질하려 들 것이나, 그러나, 그 질문에 정답은 즉각적으로 주지 못하지만 묻고 답하고 논쟁하는 기나긴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상식이나 전통이나 관행이나 관습이나 편견이나 습관이나 욕망이나 모순이나 독단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가능성의 세계에 들어가는 천금의 소득을 거두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질문을 여전히 궁구하고 또 그 질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우주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끊임없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더없이 값어치 있는 일일 것이다.
게다가 현대사회가 얼마나 네트워킹networking하는가 생각해보라. 혼자서 살 수 없다. 내가 제대로 살려면 가족도 친구도 돈도 지식도 직장도 건강도 안전도 있어야 한다. 학문도 마찬가지다. 인문학도 철학도 사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사람이 그 중요성만 외쳐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에 더하여 국가가 나서서 지원도 해주어야 하며 기업들이 그에 동참도 하여야 하며 기부가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달리 표현해보자. 인문학은 절대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는 신념을 정부는 우선하여 정책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미래에는 자기 전공 외에도 철학도 공부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해보라. 기업도 자기 분야뿐 아니라 논리적 훈련까지 되어있는 인재를 구하려고 노력해 보라. 그리고 생명공학과 더불어 인문학도 미래 우리를 먹고살게 해줄 분야라는 생각으로 기부독지가들은 인문학연구에도 돈을 내어달라. 이렇듯 인문학의 위기는 인생의 목적을 재음미해보고, 인문학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며, 그리고 그 학문이 성장하기 위한 가로세로 연결된 제반 환경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비로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 아닌가. 밖에서 인문학의 무용론을 꾸짖는 사람들도, 안에서 위기의식으로 좌절하는 사람들도 대척하는 사이가 아니다. 도리어 다 함께 창조의 동반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