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M, L, XL… 옷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크기를 알아야 한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크다면 옷을 자연스럽게 입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해진 사이즈에 몸을 맞추며 살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는 몸의 크기를 임의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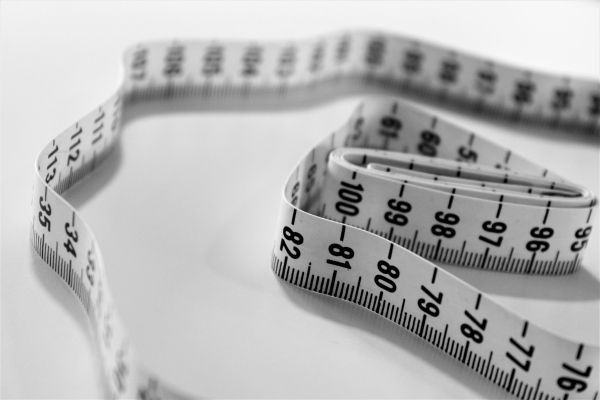
옷에서 사이즈가 구분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이후의 일로, 남북전쟁 당시 군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군인을 ▶소 ▶중 ▶대 ▶특대의 네 가지 크기로 구분하면서부터다. 그전까지는 맞춤 제작으로 옷을 구입했다. 이후에 사이즈 개념이 일상복으로 넘어온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다. 남성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성은 텅 빈 공장과 일터를 채웠고, 이때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유니폼을 제작하기 위해 표준화된 사이즈 시스템이 형성됐다. 그때까지도 여성은 주로 맞춤 제작으로 옷을 입어왔으나,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옷의 수급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제 사이즈를 구분해서 옷을 제작하는 방식은 보편화되고 정례화됐다. 그러나 이 방식은 ‘표준'의 신체 크기를 강조하며 표준을 벗어난 몸을 배제하고, 성별, 신체 사이즈에 따라 몸을 나누는 방식을 규범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즈별로 옷을 대량 생산하느라 생산량도 많아졌다. 사이즈별로 소비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 재고 관리도 까다롭다. 사이즈라는 개념은 날씬한 몸의 강요, 쌓이는 재고와 폐기물 문제라는 패션 산업의 문제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이즈의 구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옷을 만들고 입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양복은 몸의 크기에 딱 맞춰 옷을 만든다. 그래서 몸의 크기를 미리 알고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을 살펴보면, 천을 바닥에 납작하게 펼쳐둔 상태에서 자르고 꿰매 만든다. 예전에는 집에서 아이의 어깨너비, 팔 길이 정도만 재고 원단을 척척 잘라 옷을 만들기도 했다. 넉넉한 사각의 천은 몸에 걸치면 자연스럽게 몸을 감쌌기에 가능했다. 옷을 몸에 맞추니 명확한 사이즈가 없어도 괜찮았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견은 우리의 전통 복식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사이즈 개념의 한계가 서구화된 복식 체계의 한계라는 것이다. 서구의 방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옷을 만들고 입는 다양한 방식이 잊혔을 것이다. 당연하게 여겨온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잊히고 소외된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
김희량 칼럼니스트





